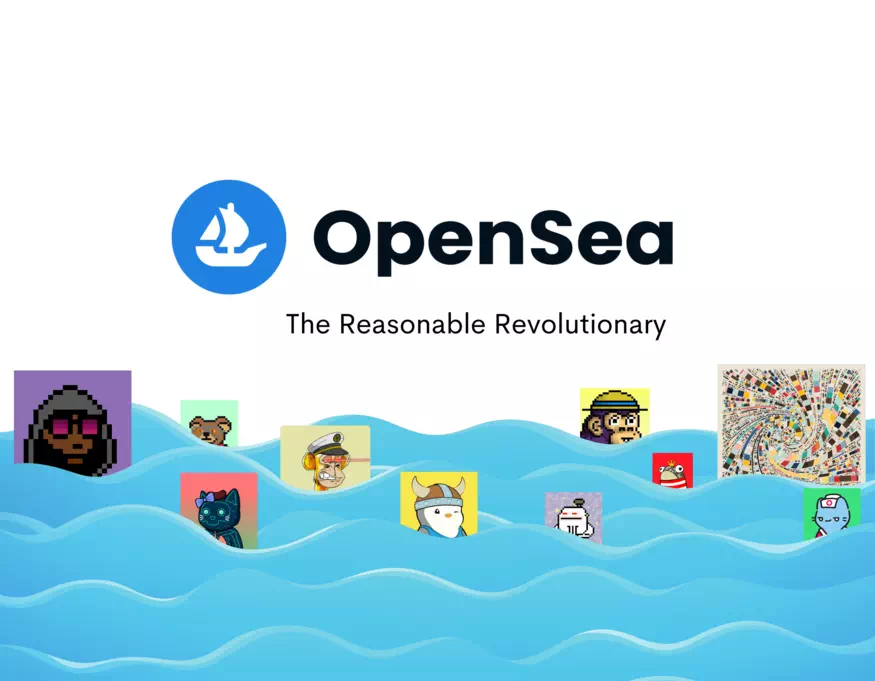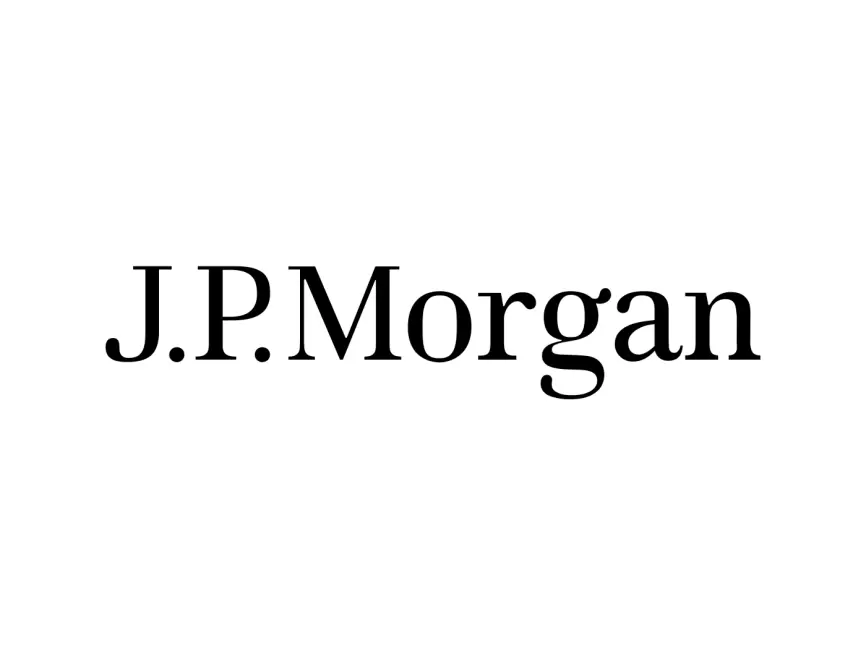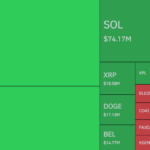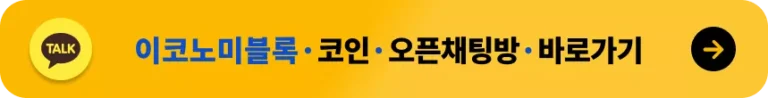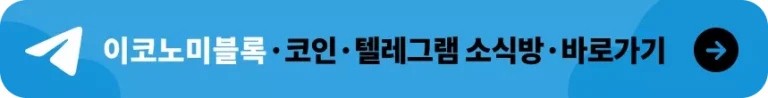골드만·BOA “내년 1온스 5000달러 전망”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월가가 금값의 기록적 상승세 앞에 결국 항복했다”고 보도했다.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이 금에 대한 ‘마지못한 지지’를 보낸 것이 전환점이었다. 다이먼은 “내 인생에서 포트폴리오에 금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반쯤 합리적인 몇 안 되는 시기 중 하나”라며 “직접 매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 보유에는 4%의 기회비용이 든다”며 “그만큼 돈을 단기금융시장에 두면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금값의 가파른 상승세는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흐름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의 최신 펀드매니저 조사에서 39%가 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상승장을 놓쳤다. 금은 이자 수익이 없고 공정가치 평가도 어렵다는 이유로 포트폴리오 내 비중이 낮은 자산이다. 리서치업체 알파인매크로는 금의 총생산비용을 온스당 1500달러(약 210만원)로 추산했지만, 이는 온스당 4200달러를 넘은 현 시세나 내년 5000달러(약 7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월가에서는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중앙은행이 저금리를 유지하고 주요 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베팅—가 시장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주요 투자은행의 원자재 담당 애널리스트들은 일제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내년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투자 수요다. 보고서는 “투자자가 금 매입을 14%만 늘려도 금값은 5000달러에 도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승세는 중국에서 시작됐다. 중국 인민은행과 가계가 금 보유를 꾸준히 확대하면서 시장의 ‘골드 버그(Gold Bug·금 매입 열풍)’가 촉발됐다. 이후 미국으로 불길이 번지며 개인투자자들도 적극적으로 가세했다. SPDR 골드 셰어즈 등 금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최근 거래량과 자금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올해 주식시장에서도 주요 흐름을 주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이른바 ‘맘앤팝 트레이더(개인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며 “이들이 주목하는 자산군에서는 과거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조정이 예측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금값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26일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 리사 쿡의 해임을 지시한 뒤 약 25% 상승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면서 쿡은 여전히 연준에 남아 있다.
블룸버그는 “금값 움직임에서 스토리텔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국 가계가 금을 인플레이션과 달러가치 하락의 방어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상승폭은 제한이 없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민간이 보유한 국채의 1%만 금으로 이동해도 금값은 온스당 5000달러에 도달한다”고 분석했다. 다이먼 역시 “이런 환경에서는 금값이 5000달러, 심지어 1만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행보도 변수로 꼽힌다. 인민은행은 11개월 연속 금 보유를 늘려왔지만, 온스당 4200달러를 넘은 현 수준에서도 매입을 지속할지는 미지수다. 블룸버그는 “베이징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 경험을 통해 원자재 패권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된 만큼 인민은행은 금 매입을 계속할 여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유동성의 파도 앞에서는 누구도 역행할 수 없다”며 “금값 급등이 월가에 현기증을 주고 있지만, 시장은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월가 경영진은 고객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금을 외면할 수 없으며, 다만 이 흐름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의 신뢰를 건 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