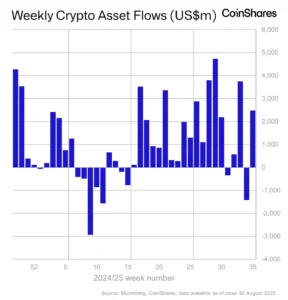확장성·경제성 부족, 실사용 플랫폼 한계
기술 발전 이어져…차세대 디앱 인프라 기대
이더리움 메인넷이 출시된 지 오는 7월 30일로 10년을 맞는다.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처음 세상에 알린 이더리움은,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소프트웨어 철학이었다. 중앙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사용자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비전은 유토피아적 이상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온체인 아마존’, ‘탈중앙화 이베이’ 같은 대규모 소비자 중심 서비스는 등장하지 않았다. 카터 펠드먼 사이 프로토콜 대표는 “가장 큰 장애물은 확장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스타그램은 하루 10억 장 이상의 사진을 처리하고, eBay는 분기당 170억달러 규모의 거래를 지원한다. 반면 이더리움은 초당 14건, 솔라나는 1000건 이상을 처리할 뿐”이라며 “수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베이를 예로 들면, 상품 등록·가격 변경·입찰·에스크로·배송 확인·이용자 평판·세금 정산·신원 확인 등 거의 모든 활동이 온체인 거래를 요구하게 된다. 단순 결제 시스템을 넘어선 복합적 기술 인프라가 필요한데, 현재 블록체인은 이를 감당할 처리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도 문제가 크다. 이더리움 기반 NFT 마켓 오픈시는 높은 수수료와 거래 금액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상재 거래가 중심이 되는 대중적 마켓플레이스를 구현하는 것은 더 큰 장벽이라는 것이다. 낮은 단가, 잦은 거래를 요구하는 게임 아이템 마켓 등도 현재의 경제 구조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기술 발전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로 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기반 기술을 통해 수백만 건의 거래를 병렬 처리하는 방법론이 등장하면서 확장성과 보안성 모두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펠드먼은 “트랜잭션당 비용이 사실상 0에 수렴하는 구조가 가능해지고 있다”며 차세대 디앱 인프라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지난 10년이 느렸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